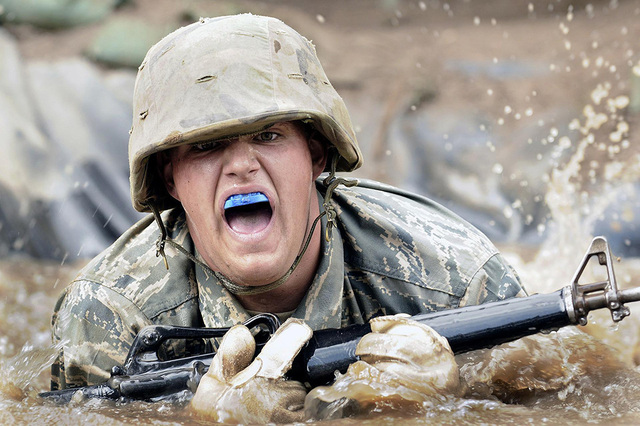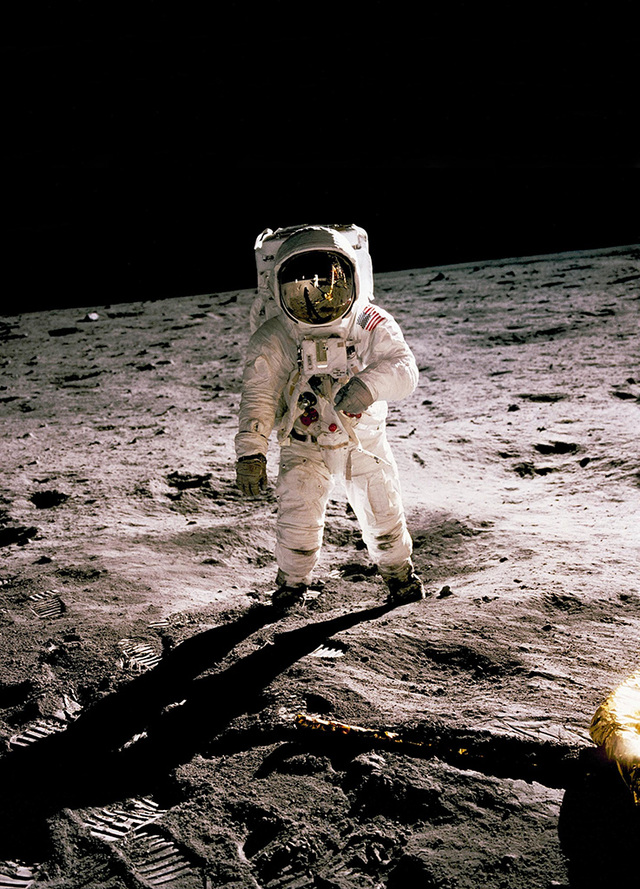음식점 벽면에 ‘○○의 효능’이라는 설명문이 붙어 있는 걸 자주 본다.보양식으로 알려진 흑염소나 삼계탕, 장어를 파는 집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순대국밥집에는 ‘순대의 효능’, 삼겹살집에는 ‘돼지고기의 효능’, 족발집에는 ‘족발의 효능’이 붙어 있다. 대개 기력을 보충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며, 피부미용에 좋다는 상투적인 얘기들이다.음식점뿐만 아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면 ‘황토방의 효능’, ‘해수 목욕의 효능’, 심지어 ‘세신의 효능’도 있다. 산림욕장 입구에는 ‘산림욕의 효능’, ‘맨발 걷기의 효능’이 있고, 헬스클럽에는 ‘피트니스의 효능’이, 지하철 계단에는 ‘계단 오르기의 효능’이 있다.이쯤 되면 그야말로 ‘효능의 민족’이 아닌가 싶다. 몸에 좋다더라, 어디에 효과가 있다더라 하면 사람들은 관심을 보인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효능’들이 태어나고 있다.하도 효능, 효능 하니까 궁금해서 검색해봤다. 과연 이런 것들도 효능이 있을까?햄버거의 효능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이 고루 들어 있어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 피자의 효능은 “암 발생 억제 효과가 뛰어나고,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 좋으며, 영양학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다. 떡볶이는 “위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촉진”하고, 비엔나 소시지는 “당질의 대사를 도와 에너지를 만들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판토텐산 성분이 동맥경화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콜라는 “위장의 산성도를 낮추어 위장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라면에는 “신경통, 관절염, 편두통, 난청, 야뇨증, 변비, 만성피로를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들을 왜 정크 푸드라 불러온 걸까? 저 휘황찬란한 효능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햄버거, 피자, 떡볶이, 소시지, 콜라, 라면에게 사과해야 한다.이쯤 되니 호기심이 더 깊어진다. 소주의 효능은 다음과 같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대변을 굳게 하며, 기생충을 없애주고, 뭉친 것을 흩어주며, 가래를 삭히고, 습한 것을 말리고, 한기를 없애준다” 그럴듯하다. 담배의 효능도 있다. “구강 점막을 경화시키며 궤양 점막을 유발하는 입안 세균을 사멸시켜 구내염을 예방한다”고 누군가 적어놨다. 심지어 코인노래방의 효능도 있다. “피부가 탱탱해진다, 여자는 S라인이 되고 남자는 정력이 좋아진다, 칼로리 소모로 살이 빠진다, 우울증이 해소되고 얼굴이 동안이 된다, 득음이 가능하다, 연예기획사에 캐스팅될 수 있다, 남녀가 함께 들어갈 시 ‘썸’을 탈 확률이 높아진다” 등이다. 효능에 미친 ‘효능 공화국’을 유쾌하게 풍자한 것이다.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의 존재목적과 가치를 갖는다는 범우주론적 믿음이 수많은 ‘○○의 효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나는 얼마 전 ‘인사청문회의 효능’을 제대로 체험했다. 정치 혐오론자, 정치 회의론자인 내가 정치인들 덕분에 웃은 것이다. 웃음에는 “코티솔 수준을 낮추고 면역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억제 작용을 상쇄하고, 카테콜아민이나 엔도르핀처럼 사람들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하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이병철 문학평론가이자 시인. 낚시와 야구 등 활동적인 스포츠도 좋아하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의원이 보여준 ‘개그 콘서트’가 많은 이들을 웃겼으니, 감사하다. 국민들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들은 각각 ‘이모 교수’를 엄마의 자매인 이모로 오해하고, ‘한국3M’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라 억지 부리고, 술에 취한 듯 고성을 버럭버럭 질러댔다. 오해, 억지, 고성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궁금하다.웃음에 효능이 있다지만 쓴웃음에는 아무런 효능도 없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보다가 결국 쓴웃음을 짓게 됐다. 쓴 약이 몸에 좋다던데, 쓴웃음도 쓸 데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 뽑은 게 엊그제인데 며칠 뒤면 또 선거다. 선거에는 어떤 효능이 있기에 저토록 공천에 매달리고 당선되려 사력을 다하는 걸까? 나에게 있어 선거의 유일한 효능은 공휴일이라는 점이다. 아침 일찍 그나마 덜 웃기는 사람한테 투표하고 낚시나 다녀와야겠다. 낚시에는 스트레스 해소, 체력증진, 제철생선 섭취 등의 효능이 있다.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