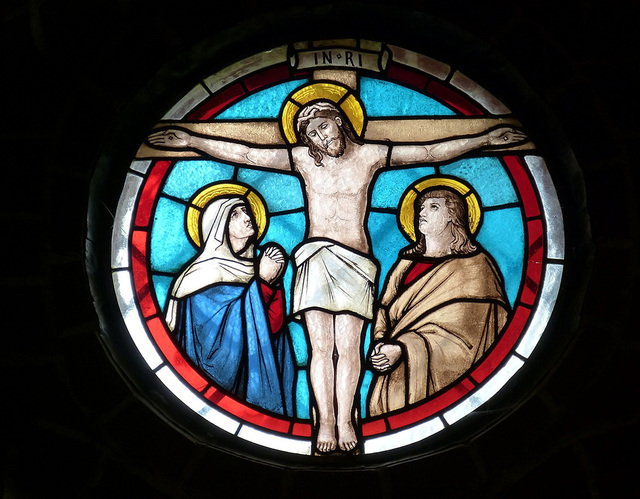어린 시절 추억을 자극하는 짜장면.
내가 사는 동네에 ‘복무춘’이라는 오래된 중국집이 있다. 나는 매일 그 집 앞을 지나간다. 춘장 볶는 냄새, 양파와 돼지고기가 커다란 웍에서 지글지글 볶아지는 소리, 달콤새콤한 탕수육 소스 향기, 윤기가 반들반들한 짜장면과 얼큰해 보이는 짬뽕… 시각과 후각, 청각을 모두 사로잡아 유혹하는데, 미치겠다. 다른 음식들도 침샘을 자극하지만 짜장면만큼 강력하진 않다. 짜장면은 내 소울 푸드다.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갔다.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맛있게 먹었다. ‘역시 이 맛이야’, 계산하려는데, 카드 단말기가 고장 났다고 한다. 아주머니께서 그냥 다음에 갖다 달라신다. 아니, 요즘 어떤 세상인데. 금방 은행 들러 현금 뽑아 갖다 드렸다. 삐거덕 소리를 내는 낡은 철문을 열고 나오자 옛 추억이 하나 떠올랐다.어릴 때 동네에 영빈관이라는 중국집이 있었다. 엄마한테 듣기로는 아버지 친구분이 하시는 집이었다. ‘아빠 친구 식당이니까 짜장면 한 그릇쯤 그냥 주겠지’ 싶어서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친구랑 그 집엘 가 “저 가방공장 아들인데요” 했더니 정말 공짜로 먹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랬다. 하루는 친구들 잔뜩 데리고 가 “나만 믿어” 큰소리치고 짜장면 한 그릇씩 먹였다. 어깨가 으쓱했다.이제 와 기억하니 내가 “가방공장 아들”이라고 했을 때 주인 내외분은 어리둥절해 했던 것 같다. “누구라고?” 한참 골똘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다. ‘같다’가 아니라 ‘다’, 확실하다. 그 시절 동네엔 영빈관 말고도 신흥원, 양자강 등 다른 집들도 있었으니, 아마 엄마가 다른 집과 착각했거나 영빈관 주인께서 아버지와 친우관계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맹랑한 소년의 터무니없는 공짜 주문이었지만, 내가 올 때마다, 심지어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는 날에도 “곱빼기로 줄까”, “밥도 줄까”, “더 먹어라” 하셨다. 자식 같아 귀엽고 한편으론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그런 정이 있던 시절이었다.요즘 온라인에서 ‘돈쭐’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돈’과 ‘혼쭐’의 합성어인데, “돈으로 혼쭐을 내준다”는 의미다.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들을 돕는 등 남몰래 선행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거나 정직한 양심으로 오랜 세월 장사했음에도 건물주의 갑질 등 횡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착한 가게’들을 찾아가서 매상을 잔뜩 올려주는 게 ‘돈쭐’이다.한 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며 떼 쓰는 어린 동생 손을 잡고, 가진 돈 전부인 5천원을 꼭 쥔 채 치킨집 앞을 서성였다. 장사가 안 돼 가게 앞에 나와 밤하늘을 보며 한숨 쉬던 치킨집 사장님은 대번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했다. 5천원어치만 먹을 수 있냐고 묻는 형제에게 가게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치킨을 푸짐하게 내줬다. 코로나로 매출이 반토막 나 월세마저 밀렸지만, 돈은 받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알사탕을 쥐어줘 보냈다. 그 후로 초등학생 동생은 몇 번 더 가게를 찾아갔다고 한다. 이 미담은 고등학생인 형이 치킨집 본사로 편지를 보내 알려지게 됐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중이라고 한다.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가게 상호와 위치를 공유해 그야말로 잔뜩 ‘돈쭐’을 내줬다.
이병철 문학평론가이자 시인. 낚시와 야구 등 활동적인 스포츠도 좋아하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중학교 교복을 입으면서부터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수년째 지방 어딘가에, 엄마는 식당에, 포장지 공장에, 인력사무소에. 그래서 나는 학교 마치면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 폐지 줍고, 혼자 사당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 던지고 공 차고, 혼자 철가방 들고 분식집 오토바이 배달하고 그랬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아무 데서나 자고 어디서 싸우다 두드려 맞고 그랬다. 술 취해 비틀거리는 새벽길에 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 혼자 기도했다. 가족들이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해달라고.이젠 그 비틀거리던 날들도 다 추억이 됐지만, 짜장면 냄새는 아직도 코끝에 향기롭다. IMF 사태로 아버지 가방공장 망하고, 얼마 안 가 영빈관도 없어졌다. 기억난다. 춘장 볶는 냄새가 달큼했던, 사진관 맞은편 속옷가게 건물 그 지하 식당. 엄마가 돈 빌렸다는 계란집을 피해서 일부러 빙 돌아 숨어 들어가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이 있던 그 중국집. 지금도 어디선가 장사하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찾아가 돈쭐을 내드리고 싶다.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