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줍게 건네준 노란 봉투를 한참이나 응시했다. 그 위를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는 사과 모양의 캐릭터 스티커는 아이의 취향과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작고 귀여운 인장이 오늘따라 유독 묵직한 작별의 무게로 다가온다. 6년이라는 시간, 한 아이의 유년이 저물고 청소년기라는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기까지 우리는 이 좁은 방에서 서로의 세계를 공유해 왔다.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는 낯선 세상을 경계하는 어린 짐승처럼 눈의 초점이 흔들렸다. 스승과 제자라는 정형화된 틀 안에서 지식을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어느덧 서로의 사소한 일상과 깊숙한 사생활의 편린까지 공유하는 해후로 변모해 갔다. 아이는 성적표의 숫자로 고민했고 그 숫자보다 더 치열했던 사춘기의 고민을 내어 놓았다. 나는 어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삶의 고단함을 털어놓고 아이의 순수한 시선에 기대어 위로받곤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훈습(薰習)되어 갔다. 향기가 옷에 배어들 듯, 아이의 싱그러운 에너지는 나의 무채색 일상에 생동감을 불어넣었고 나의 신중한 언어들은 아이의 거친 감정들을 다듬어주는 정원이 되었다.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누군가와 이토록 순수하게 마음을 겹칠 수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축복이었다. 때로는 작은 초콜릿 하나로, 때로는 아이의 어머니가 구운 정성스러운 빵으로, 작은 소품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던 그 시간들은 단순한 물질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편이라는 이심전심의 의식 같은 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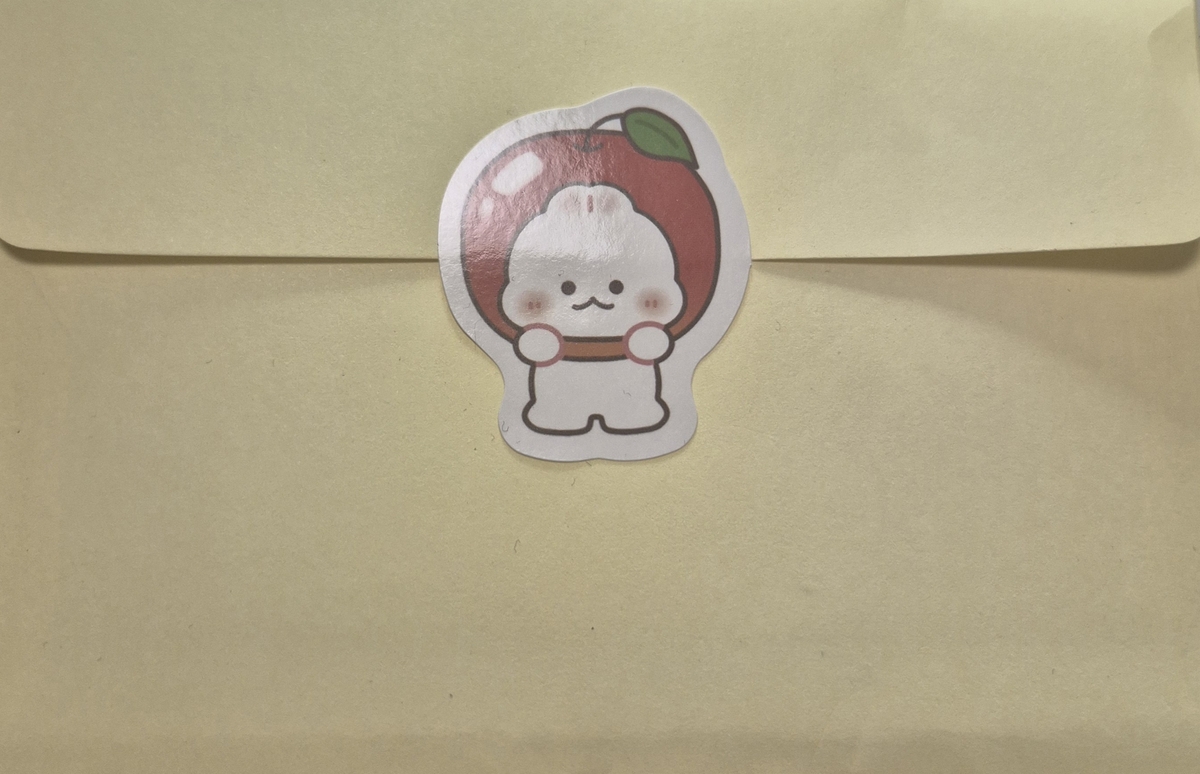
아이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좀 더 큰 도시로 이사를 갔다. 현실적 이별을 앞두고 내 손에 이 편지를 쥐어주었다. 6년의 세월을 종이 한 장에 가두기엔 턱없이 부족했을 터다. 하지만 봉투를 열기 전에 전해오는 아이의 감정은 우리가 함께 건너온 시간이 값지고 소중했음을 증명했다. 누군가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 영혼의 문턱을 함께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숭고했다.
나도 아이를 위해 손글씨로 편지를 적었다. 지난 6년, 아이의 키가 한 뼘씩 자랄 때마다 내 마음의 부피도 함께 커졌다고 고백하고 싶었다. 작은 선물과 함께 나의 진심을 담은 문장들을 봉투에 담았다. 수필의 행간마다 아이의 이름을 새기듯, 그동안 갈피에 숨겨두었던 문장과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많은 길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건넸다. 아이가 나를 통해 세상이 조금 따뜻하다고 느꼈으면 좋겠고 각박한 세상의 파고를 견뎌낼 수 있는 작고 단단한 방패를 만들었기를 기대했다.
마지막 수업이 마쳐야 할 시계의 숫자가 바뀌며 우리는 책을 덮었다. 방문을 나서는 아이를 불러 세워 가만히 안아 주었다. 여리던 어깨가 어느덧 듬직해졌다. 나는 이 아이의 청소년기라는 거대한 숲을 함께 산책했음을 깨달았다. “잘 지내, 언제든 전화하고, 샘 보고 싶다고 울지 말고” ‘울지 말고’라고 말했지만 정작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은 건 나였다. 아이 앞에서 주책맞게 자꾸 눈물이 나왔다. 다시 가다듬고 아이를 보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아이의 잔상을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긴 시간을 공유한 우리가 나눌 수 있었던 정직한 인사였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수많은 아이들이 썰물처럼 밀려왔다 밀물처럼 떠나가는 이 학습 공간에서 왜 유독 이 아이에게 나의 마음은 정박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아이가 나에게 내비친 영혼의 투명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전달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에서 굽은 이야기까지 나누며 서로의 고독을 어루만지고 인간적인 온기를 수혈받았던 평등한 교감이 있었기에 이 아이의 부재가 그토록 아쉬웠음을 확신했다.
이제 아이는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할 것이다. 비록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겠지만 우리가 나눈 애틋하고 비밀스러운 대화들은 아이의 마음 속에 단단한 뿌리가 되어 줄 것이다. 아이와 내가 교환했던 이 편지는 안녕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삶에 심어둔 다정한 씨앗이 어디서든 꽃 피울 것임을 약속하는 쉼표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내 책상 위에는 아이가 남기고 간 노란 봉투만이 윤슬처럼 남아있다. 돌아보면 6년은 시험의 터널이나 막막한 사춘기의 방황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로 인해 서로의 앞날을 비추어주던 여명의 시간이었다. 물리적 동행은 이제 멈췄지만 우리의 여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찬란한 아침을 향해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을 것이기에 나는 또 다음 수업을 준비한다.
/김경아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