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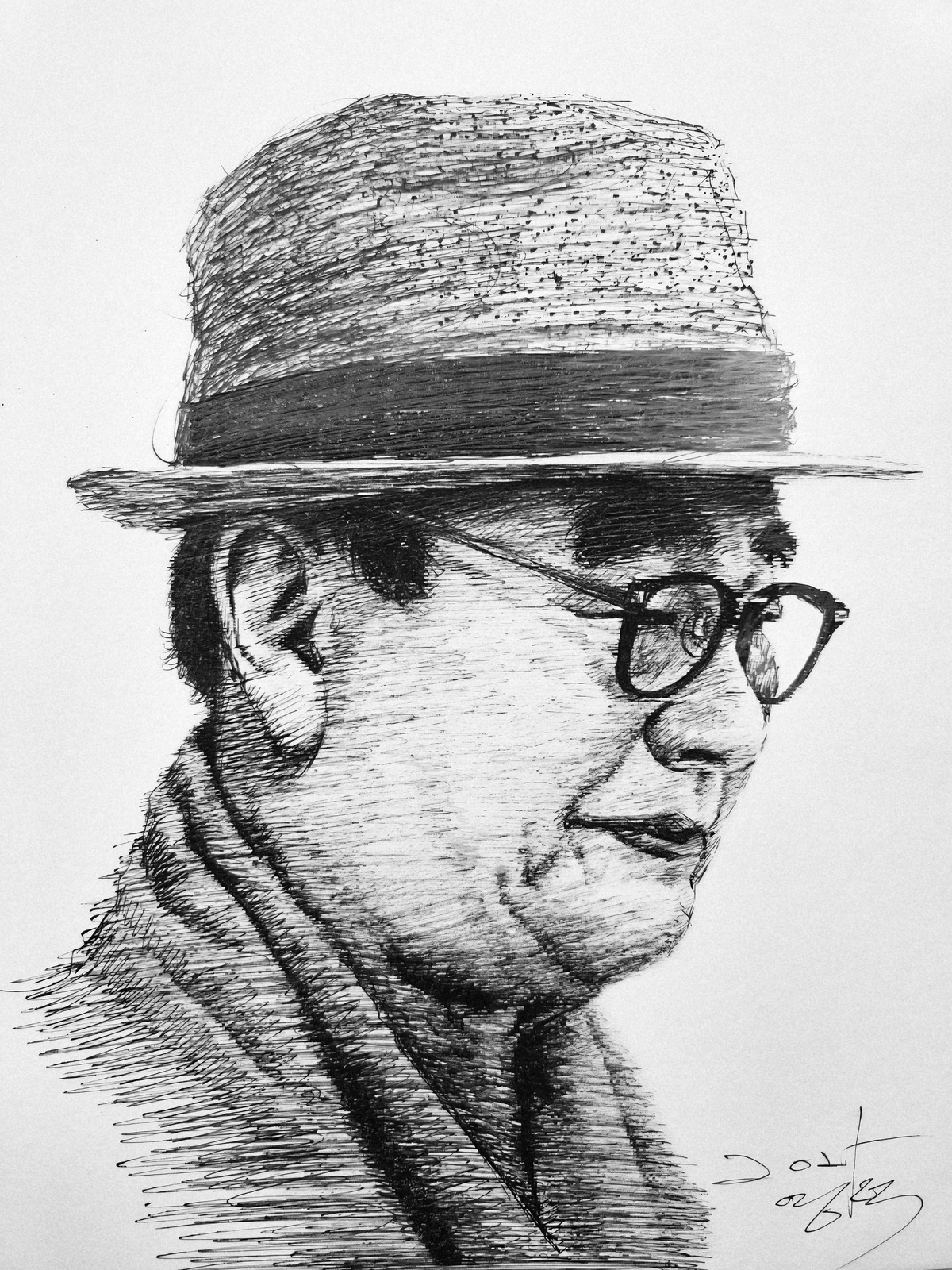
참으로 억울한 이름이다. 개망초라니.
이 순한 얼굴에 ‘개’자를 붙인 것도 모자라, ‘망할 망(亡)’ 자까지 덤으로 얹었다. 누가 봐도, 이건 꽃에게 붙이는 이름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깝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변 어디에나 흔히 피어 있는 꽃이다. 도심 화단, 아스팔트 틈새, 고속도로 옆, 밭두렁···. 심지어 버려진 집 마당에서도 활짝 웃고 있다. 귀여운 얼굴에 노란 동그라미 하나 톡 찍힌 모습은 계란프라이를 닮았고, 티 없이 맑은 미소는 동네 꼬마가 “안녕하세요~” 하고 손 흔드는 듯하다. 이런 꽃을 두고 ‘개망초’라니. 누가 이름 짓다가 술김에 그랬는지, 참 짓궂기도 하다.
그 억울한 유래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북아메리카에서 철도 침목에 실려 온 이 꽃. 한국 땅에 무단 입국한 건 맞지만, 처음부터 그런 비운의 이름을 달 생각은 없었을 거다. 그런데 철로를 따라 일제히 하얗게 피어나자 일본인들이 잔뜩 겁을 먹었다. “이거 조선이 살아나려고 그러나?”가 아니라, “조선이 망할 조짐이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망초(亡草)’가 되었고, ‘개’까지 덧붙여 ‘개망초’로 진급했다. 꽃으로는 처음일 거다. 무슨 중죄라도 진 양 이름을 달게 된 건.
젊은 시절,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군 복무를 했다. 낮에는 총 들고 뛰고, 밤엔 보초 서며 졸음을 쫓았다. 그러다 문득 초소 앞 언덕에 핀 개망초를 보곤 했다. 하얀 꽃들이 밤안개 속에 소금 뿌린 듯 깔려 있었다. 혼자 피었을 땐 눈에 띄지 않던 꽃이, 무리 지어 피어 있으니 제법 위엄도 있었다. 그 하얀 군락을 보며 가끔 나도 모르게 중얼댔다. “야, 너희도 잠 안 자냐?”
그런데 그런 애잔한 기억의 꽃이 ‘망조’라니. 일제가 이 꽃을 싫어한 이유는 아마도 뭉쳐 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개망초처럼 조선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자기들이 곤란하니까, ‘이 꽃 피면 망조’라고 겁부터 먹은 게 아닐까. 꽃에 주술적 의미를 씌운 것도 모자라, ‘개’ 자까지 붙여 기를 꺾으려 했던 것이다. 도무지 일제는 꽃 이름 하나 지을 때도 집요하고 옹졸했다.
그러나 “이제 이름 좀 바꿔줘야 하지 않겠나?”
망할 망(亡) 자 대신 바랄 망(望) 자로 바꾸면 어떨까? 그리고 그 앞에 ‘기쁠 희(喜)’ 자까지 얹어 ‘희망초(喜望草)’! 듣기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어딘가 힘이 솟는 이름이다. 개망초가 아니라 ‘희망초’라면, 길가에 피어 있어도 사람들 눈빛부터 달라질 것이다.
생각해보면, 개망초야말로 희망의 꽃이다. 화단에서 사치스럽게 가꿔지지도 않고, 비료 한 톨 못 받아도 꿋꿋하게 자란다. 아스팔트 틈바구니에서조차 굳센 생명력으로 꽃을 피운다. ‘개’ 소리 듣고도 주눅 들지 않고, ‘망조’란 이름 붙여도 매년 잊지 않고 돌아온다. 이런 꽃이야말로, 우리네 인생과 닮았다.
사람도 그렇지 않은가. 이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눅 들고 억울한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름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뿌리를 내린 태도가 진짜 그 사람이다. 개망초도 마찬가지다. 이름은 억울해도, 살아가는 모습은 당당하고 곧다.
그래서 올해는 화분 하나에 망초를 심고, 이름표를 붙여줄 생각이다. “희망초 – 기쁨을 바라는 꽃.” 보는 이마다 궁금해할 것이다. “이 꽃이 무슨 꽃이에요?” 그러면 나는 웃으며 대답할 것이다. “옛날엔 개망초였는데, 요즘은 희망초라고 불러요. 시대도 바뀌었잖아요?”
/방종현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