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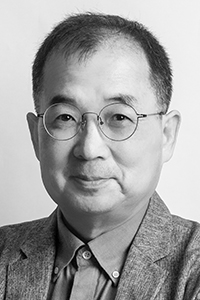
뉴스의 분량과 속도는 숨이 가쁠 만큼 거세고 빠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국제 정세가 뒤집히고, 경제 지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는다. 대체로 불안과 분노, 피로와 공포를 전한다. 그런 가운데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 예년 같았으면 거리의 전광판이 바빠지고 포털의 첫 화면이 요란했을 텐데, 이번은 왠지 비교적 차분하다. 마치 세상의 소음에 묻혀 설원 위의 함성이 멀게만 들려오는 느낌이다. 스포츠가 차지하던 자리를 이제는 수많은 뉴스와 이슈들이 차지해 버렸다. 전쟁과 갈등, 정치현안과 경제불안이 일상화된 시대에 올림픽축제는 잠시 숨을 고르는 틈새 정도로 취급되는 듯하다. 그래도 화면을 조금만 멈춰 바라보면, 그 ‘틈’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장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온다.
빙판을 가르는 스케이트 날은 군더더기 없는 선으로 시간을 자르고, 설산 언덕을 질주하는 선수의 몸짓은 중력을 거부하는 하나의 곡선이 된다. 촌각을 가르는 승부 뒤에는 수년의 반복과 실패, 부상과 회복이 숨 쉬고 있다. 무명의 젊은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만들어 올리는 동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며 환희다. 박수는 메달 색깔이 아니라 그 과정에 먼저 가닿아야 한다는 사실을 올림픽은 조용히 숭고하게 상기시킨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아직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짊어진 개인들의 시간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훈련장을 오가며 흘렸을 땀, 남들보다 한 발 일찍 빙판에 서야 했던 새벽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다시 장비를 고쳐 신었던 순간들. 우리는 국기를 배경으로 선 시상대 장면만을 기억하지만, 올림픽의 진짜 이야기는 대부분은 그 이전의 드라마로 채워져 있다.
동계올림픽이 던지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속도의 대비다. 일상의 뉴스는 즉각적인 판단을 요구하지만, 스포츠는 기나긴 기다림을 전제로 한다.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수백 번의 실패가 필요하고, 4년에 꼭 한 번 무대를 위해 선수들은 오랜 시간을 견디고 견딘다. 신속한 결론에 익숙해진 사회에서 우리는 시간의 느린 리듬이 낯설다.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과정을 지켜보는 끈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지낸 필수 감각이 아닐까. 아직 열흘 일정이 남아 있다. 많은 경기와 많은 얼굴들이 등장할 것이다. 어떤 이는 환호를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한 채 돌아설 수도 있다. 설산과 빙판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간만큼은 모두에게 같은 무게를 지닌다. 그런 장면들이 세상의 소음과 잡사에 묻히지 않기를 기대한다.
복잡한 시대에 올림픽은 현실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라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비춰주는 거울이 아닐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실패를 딛고 서는 인내, 상대를 존중하는 용기. 이번 겨울,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기대보다 차분한 응원이다. 화면 너머로 보내는 작은 박수 하나가 긴 시간을 견뎌온 이들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 마지막 남은 열흘, 우리가 젊은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