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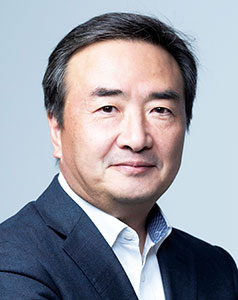
정부 이양이 소란하다. 어떤 자리도 전·후임자 사이가 좋기는 쉽지 않다. 비교당하고, 궂은일의 책임과 좋은 일의 공덕이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제왕적’이라는 말을 듣는 대통령 자리는 오죽할까. 같은 정당 내에서 정권을 넘겨도 전·후임자 사이에 앙금이 남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니 정권 교체에서는 어느 정도 잡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좀 지나치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일도 대통령과 당선인이 대립할 문제는 아니다. 집무실은 쓸 사람이 결정할 몫이다. 여론을 물어보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일 수는 있지만 방을 비워줄 전임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건 남의 집 제사상 간섭하는 꼴이다.
물론 그 일이 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견한다면 거기까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청와대를 시민에게 공개하려면 후임 대통령이 입주할 때와는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일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서두를 이유는 없다.
최근 여론조사마다 과반수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 이런 탓인지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55%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87%, 박근혜 전 대통령은 78%, 이명박 전 대통령은 84%였다.
선거가 끝나면 새 대통령에게 기대가 모이는 게 정상이다. 저조한 기대치는 선거전이 격렬했던 탓도 있지만, 그 후유증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실행이 더디다는 말이다. 당선인과 그 측근들이 던지는 말들이 너무 날카롭다. 반대 진영에서 승복하지 않는 언행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 통합의 책임은 결국 국정을 이끌어갈 윤 당선인에게 있다. 전임자, 경쟁 정당을 끌어안아야 한다. 국민을 설득하는 데도 실패했다.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오래 못 간다.
임기 초 지지율은 국정의 틀을 잡아나가는 동력이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특히 악재다. ‘밀월 기간’도 날려버렸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정치권이 전투 모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 대구·경북(찬성 61.4%, 반대 34.3%)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 서울은 반대 55.8%, 찬성 39.3%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호남과 세종·인천·경기·제주에서 이겼다. 그런데 민주당에 호재가 생긴 것이다. 대통령 선거의 여파가 남아 있어 판세를 뒤집기 어려웠는데, 대선 득표 차가 크지 않은 서울·충청에서 의욕이 생겼다.
문 대통령은 18일 참모진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라”고 입 단속했다. 그런데 21일 “촉박한 시일에 국방부·합참·대통령비서실 등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반대했다. 급반전의 배경이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의심받을 만하다.
대통령 선거 때도 문 대통령은 투표 하루 전인 8일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의도했건 아니건, 여성 표가 이재명 후보로 모이게 도왔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문제를 차치해도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선거 때문에 협력하지 못한다면 비극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되는 순간 국민의힘이나 지지자들의 당선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당선인이다. 집무실을 하루 일찍 옮기는 것보다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현 대통령과 경쟁 정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상대가 그 손을 잡지 않더라도, 포용하는 노력을 보이고, 국민이 거기서 진심을 느껴야 통합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분열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대 대통령은 불행했다. 이제라도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전·후임자가 손을 잡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김진국 본사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