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음처럼 차가운 계곡물
화북탐방지원센터 08:40분. 매매 바른 선크림이 땀과 뒤범벅이 되었다. 칠월의 볕만 생각하고 그 빛을 다 받아낸 나뭇잎은 생각지 못했다. 불과 몇 분을 걷지 않았는데도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산은 깊었다. 오르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없어 산길은 고요했고, 그 속에서 그늘은 그윽했다. 속리산(俗離山), 이름처럼 산은 속세를 떠나 있었다.
한참을 오른 것 같은데 푯말은 매정했다. 우리는 겨우 1.5km를 걸었다. 아직 걸어온 것보다 더 많이 걸어야 했다. 계곡에는 물이 가득했다. 세수하는 걸로는 도무지 모자라 등산화와 양말을 벗었다. 가장 깊은 곳은 허벅지까지 올 것 같았다. 두 발을 물에 내려놓고 두세 걸음을 걸었을까. 쩡한 한기가 순식간에 등을 타고 올라 머리를 때렸다.
△눈썰매, 그리고 절망과 희망의 거리
정말 덥긴 더웠다. 이런 여름이면 나는 몹시 추웠던 어릴 적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 내가 살았던 곳은 워낙 산골이라 눈이 내리기만 하면 며칠씩 내리곤 했다. 눈이 퍼붓고 나면, 꼭 비온 다음 날처럼 화창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마을 초입으로 모여 눈썰매를 탔다. 산마루에 있는 동네라 들어오는 입구는 무척 가팔랐다. 어른들은 눈썰매를 타는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다음 날은 찾아올 사람도 찾아갈 사람도 없어 그 가파른 길은 모두 우리 차지였다.
그 해 겨울도 어김없이 그랬다. 나는 며칠 째 방에 틀어박혀 있어야만 했다. 지독한 감기 때문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점심 먹고 나간 형은 여태 오지 않았고, 할아버지의 옛날이야기는 겨웠고, 잠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텔레비전은 아무리 껐다 켜도 화면조정 시간이었다. 친구들이 썰매를 타며 떠드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친구들과 함께 놀지는 못하더라도 노는 모습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할아버지의 눈을 기어, 기어이 밖으로 나오고야 말았다. 나올 때까지만 해도 좋았다.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는 잡힐 것처럼 또렷했고, 그 소란스러움에는 어떤 희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급하게 나오느라 그랬을까, 아니면 원래 양말 따위는 없었던 걸까, 엄마의 털신은 턱없이 컸다.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디뎠지만 눈은 밀려 들어왔고, 맨발로는 그 차가움을 감당할 수 없었다. 차가움은 아픔과 고통으로 모양을 바꾸곤 했다.
저 모퉁이만 돌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거기까지 걸어갈 수 없었다. 아니 어떻게든 갈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도착해도 이 추위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모퉁이 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막연한 희망이 얼마나 막막한 것인지를 이 추위만큼 선명히 알 수 있었다. 그 때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갔던 길을 되돌아오며, 나는 멀리 있는 우리 집이, 평소처럼 그 자리에 있는 집이, 오늘마저도 거기에 있어 원망스러웠다.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추위가 아니라 온전한 추위, 어떤 가식도 허위도 없는 순도 100%의 추위는 절망을 동반하고 있었다. 하지만 걸을수록 분명해 오는 것은 저기 우리 집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벌써 군불을 넣어 방은 쩔쩔 끓고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의 발을 주물러 주실 것이 분명했다. 절망과 희망은 이토록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희망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평범함 그 자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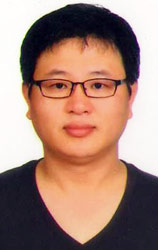
△정상의 절경
어딜 가나 산에는 헐떡, 꼴딱, 깔딱과 같은 고개가 있다. 동행한 친구도 나도, 산이 가팔라질수록 말 수가 줄었다. 이 더운 날 여길 왜 왔냐고, 나는 나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모르긴 몰라도 친구도 그랬을 것이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운 것 같은 우리는 씩씩거리며 걸었다. 이제 저 철계단을 오르면 정상에 이를 것이었다. 별 게 없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꾸역꾸역 계단을 올랐다. 산은 으레 정상과 정상이 아닌 곳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기 마련이다.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정상 아닌 곳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장대는 정상에서 섰을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우측의 기암괴석은 관음봉으로 이어져 속사치를 지나 상학봉으로 달아났다. 좌측은 칠형제봉으로 시작하여 문수봉, 신선대, 비로봉을 지나 천황봉에 닿았다. 내가 올라온 길을 덮고 있는 짙고 깊은 녹음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 산은 높았다. 나는 이 문장대 정상에서 비로소, 정상은 단지 특정한 지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아프도록 추웠던 어린 날의 겨울을 생각하게 된다. 만약 내가 추위와 아픔을 참고 그 모퉁이를 돌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뭔가 다른 색깔의 희망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아무리 그날의 모퉁이를 향해 달려가 보지만 끝내 그 모퉁이를 돌 수는 없다.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