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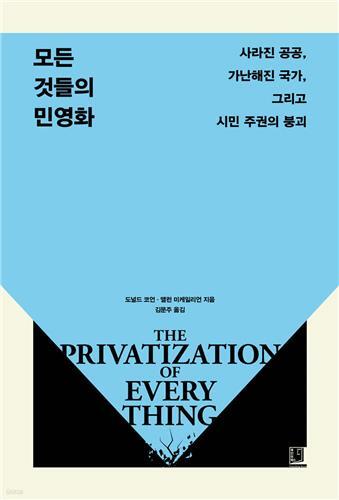
‘공공재를 잃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싸지고 불안해진다. 민영화가 일상을 바꾸고 시민의 손에서 통제권을 빼앗을 때,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후퇴하는가?’
최근 출간된 책 ‘모든 것들의 민영화’(북인어박스)는 1950~60년대 번영의 기반이었던 미국의 공공재가 1980년 레이건 정부 이후 민영화되면서 민주주의 구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날카롭게 조명한다. 상수도부터 교육, 보건, 사법 시스템까지 공공부문이 민간으로 넘어가며 시민의 통제권이 약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된 과정을 분석한 이 책은, “민영화는 시장 효율성 실험이 아닌 권력 재편의 정치적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의료·교육·교통 등에서 민영화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책은 공공성 회복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임을 경고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15년 가뭄으로 물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공영화된 지역에선 사용량 감소에 따라 요금이 인하됐다. 그러나 민영화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요금이 인상됐다. 민간 기업은 수익 하락을 메우기 위해 단위당 가격을 올린 것이다. 수도 요금 결정권이 시장에서 기업 이익 논리에 종속되면서, 공공의 감시 체계는 무력화됐고 주민들은 더 비싼 비용을 치르며 더 적은 서비스를 받게 됐다.
미국 사법 시스템의 민영화는 더욱 충격적이다. 지오 그룹(GEO Group)과 같은 민간 교도소 기업은 수감자 증가와 장기 복역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이들은 보호관찰 비용, 마약 검사 수수료 등을 추가해 원래 벌금보다 더 큰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 특히 의무적 최소형량제와 같은 법안은 사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돼, 교화와 재사회화라는 사법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 민영화된 교정시설은 인권 침해와 불평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19개 주에서 민간 통신사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 공공망을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소외 지역은 기술 발전에서 배제됐다. 이는 결국 기술 혁신이 아닌 시장 논리가 지역 발전을 좌우하는 역설을 낳았다.
차터 스쿨(독립형 공립학교)과 영리 대학의 확산은 교육의 계층화를 가속화했다. 차터 스쿨은 저소득층 학생을 배제하고, 공립학교에 남은 학생들은 자원 부족에 시달린다. 영리 대학은 ‘정원 판매’로 수익을 올려 학생들에게 막대한 학자금 빚을 안겨준다. 이로 인해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족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영화된 의료 시스템은 보험료 부담으로 저소득층 접근을 차단해 건강 격차를 심화시킨다. 학교 선택제는 인종 분리 정책을 부활시키는 도구로 악용되며, 통합 교육 시스템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공공도서관은 예산 삭감으로 서비스가 축소돼 지역사회의 지식 공유 플랫폼이 사라지고 있다. 대학의 상업화는 지식 생산의 공공성을 훼손한다.
저자들은 민영화의 대안으로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공적 통제권의 회복을 제시한다. 공공재는 시장의 실험이 아닌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이므로,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 공공성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해체 문제를 다루는 정책연구자이자 사회운동가인 도널드 코언과 작가인 앨런 미케일리언 두 저자는 “공공재는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없다면 공공성은 시장 논리에 잠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