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의 과거’<br/><br/>은희경 지음·문학과지성사 펴냄<br/>장편소설·1만4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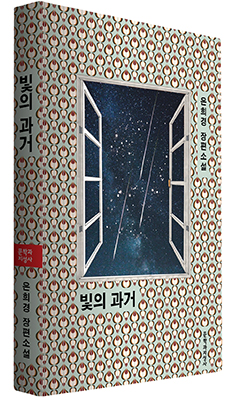
현재 한국문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소설가 은희경(60)은 풍부한 상상력과 능숙한 구성력, 감각적 문체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견 작가다. 은희경은 동시대 여성들 마음을 잘 그린 덕분에 성공적인 작가가 됐다.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이중주’로 당선된 이후 ‘새의 선물’,‘타인에게 말걸기’, ‘아내의 상자’등의 작품으로 문학동네 소설상, 제10회 동서문학상, 제22회 이상문학상, 제38회 동인문학상, 제14회 황순원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의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은희경 소설의 특징은 여성을 중심으로 그들이 겪는 일상의 고민과 문제를 심도깊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이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던 ‘여성성’을 지우고, 일탈을 시도한다.
최근 그는 장편소설‘빛의 과거’(문학과지성사)를 출간했다.‘태연한 인생’(2012년)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소설로 깊이 숙고해 오랫동안 쓰고 고쳤다.
특유의 분위기는 신작에서도 여전하다. 전작들이 그랬듯 여성들의 관계 속에서 사회성 짙은 메시지가 진하게 묻어난다.
2017년의 ‘나’는, 작가인 오랜 친구의 소설을 읽으면서 1977년 여자대학 기숙사에서의 한때를 떠올린다. 같은 시간을 공유했지만 서로가 기억하는 ‘그때’는 너무나 다르다.
은희경은 갓 성년이 된 여성들이 기숙사라는 낯선 공간에서 마주친 첫 ‘다름’과 ‘섞임’의 세계를 그려낸다. 기숙사 룸메이트들을 통해 다양하며 입체적인 여성 인물들을 제시하고 1970년대의 문화와 시대상을 세밀하게 서술한다. 무엇보다 회피를 무기 삼아 살아온 한 개인이 어제의 기억과 오늘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민낯을 직시해 담담하게 토로하는 내밀한 문장들은, 삶에 놓인 인간으로서 품는 보편적인 고민을 드러내며 독자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그렇게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는 ‘은희경’이라는 필터를 거쳐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야기는 중년 여성 김유경이 오랜 친구 김희진의 소설 ‘지금은 없는 공주들을 위하여’를 읽게 되며 시작된다. 대학 동창인 그들은 “절친하다거나 좋아하는 친구라고는 말할 수 없”고 “끊어진 건 아니지만 밀착될 일도 없”는, 어쩌다 보니 가장 오랜 친구가 된 묘한 관계다. 같은 시공간을 공유했으나 전혀 다르게 묘사된 김희진의 소설 속 기숙사 생활을 읽으며, 김유경은 자신의 기억을 되짚는다.

기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룸메이트다. 타의에 의해 임의로 배정된 네 명이 한 방을 쓰는데 ‘임의’의 가벼움에 비해 서로 주고받는 영향은 터무니없이 크다. 국문과 1학년 김유경의 322호 룸메이트는 화학과 3학년 최성옥, 교육학과 2학년 양애란, 의류학과 1학년 오현수다. 최성옥과 절친한 송선미의 방인 417호 사람들(곽주아, 김희진, 이재숙)과도 종종 모이곤 한다.
1977년의 이야기는 3월 신입생 환영회, 봄의 첫 미팅과 축제, 가을의 오픈하우스 행사 등 주요한 사건 위주로 진행된다. 김유경의 서사가 굵직하게 이어지는 사이사이, 322호와 417호의 룸메이트인 일곱 여성들의 에피소드도 다채롭게 전개된다. 그들은 각자 “성년이 되어가는 문으로 들어가” “낯선 세계에 대한 긴장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간다(2016년 작가 인터뷰). 김유경은 말더듬증이라는 약점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내리누르며, 말과 행동이 필요한 순간 입을 다문다. 회피를 방어의 수단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세상의 어중간한 어디쯤에 위치시키려 한다. 한편 누군가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다.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취향을 조용히 발전시키는 오현수, 남을 끌어내려 항상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김희진, 그와 비슷하지만 남의 눈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의 욕구 충족이 중요한 양애란이 그렇다. 지향점과 실제의 삶에 괴리가 심한 사람도 있다. 최성옥처럼 자신이 선택한 남성에 의해 그 괴리가 발생하기도 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교정하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매사 주요하게 지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발을 헛디뎌버리는 곽주아 같은 경우도 있다. 그들은 “치졸하고 나이브”(‘작가의 말’)하며, 소탈하기도 섬세하기도 하다. 선량하고도 얄미우며 까칠하면서도 유약하다. /윤희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