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쪽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에 바깥으로의 외출이 망설여지는 시기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너나없이 심란해지는 길고 긴 1월의 겨울밤.
TV와 휴대폰을 끄고 책과 만나는 것으로 외로움과 혹한을 이겨보면 어떨까? 이 방식을 택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2권의 책을 아래에서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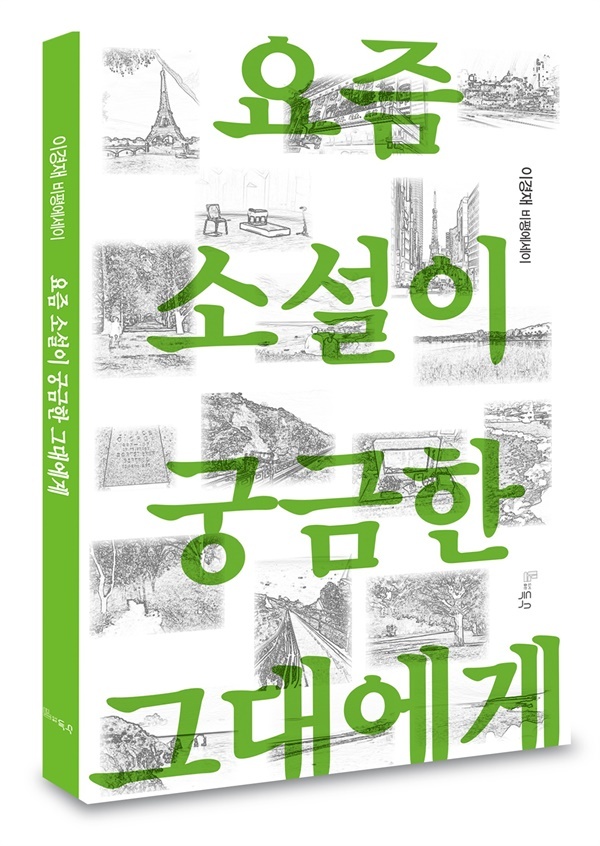
▲이경재의 ‘요즘 소설이 궁금한 그대에게’
“요즘 나오는 소설을 대할 때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직접적 감각이다. 그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서도, 카프카의 소설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오직 ‘요즘 소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흥미롭다.“
문학평론가 이경재의 말이다. 그는 여전히 소설을 통해 세상을 읽어내려 노력하는 사람 중 하나로 살고 있다. 이제는 드물어진.
소설은 허구로 만들어진 창조물.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 쓴 것이다. 그러나, 소설 속 거짓이 많은 인간을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소설의 힘이자, 문학의 효용이 아닐지.
지난 시절, 비단 문학청년만이 아닌 수많은 독자들이 소설과 시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해석하려 했다. 문학이 가진 보편과 전형의 힘을 믿었던 시대였으니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인터넷 소통과 TV에 넘쳐나는 영화와 드라마, 연예 관련 프로그램을 보며 세상을 감각하고 느끼는 세대들이 2026년 이 땅의 주류로 떠올랐다. 시간의 흐름과 세태의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본지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한 숭실대 이경재 교수가 쓴 ‘요즘 소설이 궁금한 그대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로 독자들에게 다가온다. 책은 이 교수가 36편의 소설을 읽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요즘 소설이 궁금한 그대에게’에서 언급되는 소설가와 작품은 그 프리즘이 넓다. 남녀와 노소, 주제와 소재가 다양한 것은 물론, 소개되는 소설의 형식 또한 각기 다르다.
이 책에서 이경재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에서부터 서성란, 김애란, 심윤경, 조해진, 황정은, 정용준 등의 작품을 두루 읽고, 그 작가들이 자신의 소설을 매개로 사람과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들려준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요즘 소설이 궁금한 그대에게’에서 사용된 문장과 문체는 모두 친절하다. 평소 딱딱한 비평서를 써온 학자답지 않은 말랑말랑한 문구로 편한 책읽기를 가능하게 해준다. 어렵지가 않다는 이야기.
책 속에서 발견한 걸로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나라는 장벽을 부수고 너와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는 문구, 또는 ‘어쩌면 인간은 벌레를 넘어 키오스크가 되어 가고 있지만,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타인의 얼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문장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휴대폰으로 SNS 속 짧은 영상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헌데, 가끔은 책을 통해 세상과 인간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권성훈의 ‘밤은 밤을 열면서’
기자가 아는 권성훈 시인은 싱거운 말은 물론 진지한 이야기까지 우스개처럼 하는 사람이다. 얼굴엔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미소가 내내 떠나지 않는다. 별다른 고민이 없는 중년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어법과 표정.
하지만, 정신의 고통과 육체의 고뇌 없이 생산되는 시는 없는 법이다. 얼핏 가벼워 보이는 권성훈의 제스처와 말투는 철저한 위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를 만난 지 10년이 넘어서야 알게 된 일이다. 권 시인의 선배 시인인 이승하는 권성훈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
“우리 시의 유구한 전통에서 단절된 것이 있다면 해학성 혹은 골계미다. 권성훈의 시는 끊어진 맥을 되살려내면서 유쾌한 해학, 건강한 골계미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한다. 그의 시는 재미에 그치지 않고 인간을 반성케 한다.”
‘밤은 밤을 열면서’는 지천명을 앞둔 시절 권성훈이 내놓은 절창을 모아둔 시집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시어(詩語)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우스개와 미소가 위장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거기서 가장 먼저 읽히는 건 죽음의 냄새다. 이런 것이다.
‘새끼를 키우려고 새끼를 내다 팔던 할머니/지하 골방에 죽음이 다녀갔다/개를 기르던 노인이/노인을 기르던 개가 들어 있다/홀로 두고 발길 돌리기 안타까웠는지/두 장 빛바랜 엽서처럼 붙어/서로를 애처롭게 만지고 있다….’
- 위의 책 중 ‘골방 엽서’ 부분 인용.
이른바 동반 고독사(孤獨死)다. 곁을 지켜주던 개가 노파의 유일한 말동무였을 터. 말을 할 수 없는 개였기에 끝끝내 부재했을 소통. 둘은 끌어안고 함께 죽었다. 악취 비산하는 좁은 방을 권성훈 이렇게 묘사한다.
“한 생애를 지리고 나온 부패한 사연이 지독한 흉터로 인쇄된 증표 같이 굳어져 떨어지지 않는다.”
죽음의 향기는 시집 곳곳에 잠복했다가 불쑥불쑥 나타난다. 책장을 넘기기가 저어될 지경이다. 권성훈의 어디에 이런 어둠과 그늘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남은 이유’라는 제목을 택한 시 또한 노래하는 소재가 사라짐과 소멸이다.
‘평생 농사일로 검게 탄 눈을 껌뻑이다가/장마 전선에도 쑥쑥 자란 암소 한 마리 팔아 와서/사고 쳐 징역 간 손주 녀석 한 번만 살려 달라 애원한다….’
죽음 같은 삶, 혹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이어가는 게 비단 개와 죽은 할머니, 그리고 소를 팔아 손자 구하려는 노인만일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느끼는 자들에게 세상이란 ‘죄 없이 갇힌 감옥’과 다를 바 없다. 시인은 느끼는 인간이다.
이를 알고 있는 동료시인 이수명은 “권성훈은 누군가의 통점(痛點)을 헤아리고 살피는 쪽에 서 있다. 그의 시들 역시 통점 안에서 쓰이고 읽힌다”고 해석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수난이나 고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혹한의 겨울밤. ‘밤은 밤을 열면서’는 우리에게 세계의 진실을 보여주며 어깨를 다독여줄 책이 분명해 보인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