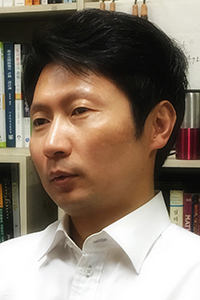
한동대 교수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역사는 큰 정책 전시관과 같다.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각종 지방경제 진흥 정책에서부터 수도권을 억제하는 정책, 그리고 최근 수도권의 행정기능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유형의 정책이 동원돼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균형발전에 대해 목말라한다. 균형발전은 신기루와 같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균형발전이란 지방의 ‘서울화(Seoulization)’로 이해되어온 듯하다. 지방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렇다. 제한된 시간 속에 사업을 따오고 결과도 얻어야 하는 지방의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선택은 다른 곳의 사례들을 가져오는 것이다. 지자체는 항상 인력, 아이디어 부족에 허덕이고, 결국 벤치마킹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곳의 사업을 모방하곤 한다. 당연하게, 모방의 대상은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들이다. 이런 ‘카피캣’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선거다. 총선, 지선을 막론하고는 대표 공약은 대부분 ‘우리지역에 이런 저런 사업을 도입하겠다’는 것들이다. 마치 지역을 수도권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공약이 많다. 이러다 보니 지역 발전 정책은 ‘서울화’ 내지 ‘서울 따라가기’가 돼버리고 만다. 하지만 형태상으로 서울을 따라간다 해도 도시의 활력은 복제될 수 없다. 결국 정책의 효과는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지방은 또 다시 좌절하게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정책에도 함정이 있다. 수도권의 일부를 지방으로 양보하는 통 큰 정책이지만 여기에도 ‘서울화가 곧 균형발전’이라는 코드가 들어 있다. 아무리 좋은 균형발전 정책이라도 지방의 독자적인 노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금싸라기 같은 수도권의 기능이라 해도 그것이 서울의 중력권을 떠나는 순간, 그 효능은 예전과 같지 않다. 지방의 자체적인 혁신이 아닌, 주어진 혁신도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화가 균형발전의 방향성이 될 수는 없다. 서울화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럴듯 해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지방의 자발성, 독자성을 잠재운다. 시간과 노력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방 도시들이 스스로의 발전 방향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의 지원사업이 구상되고 있는 점은 의미가 크다. 지방이 독자적으로 정책 사업을 기획·제안하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장려·후원하는 방식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사업의 형식과 내용, 결과물 모두에 있어 지방이 독자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깊고 깊은 지방의 위기를 충분히 살펴보고 고민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도 가능하면 제한이 없으면 좋겠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의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 각 지역의 독자적 생존력은 어차피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앞으로도 이런 접근을 통해서 탈 중심화, 그리고 지역 자립으로서의 균형발전 정책이 정착돼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