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 향기 기다리며 읽는 詩 3편

우수와 경칩이 지났으니 머지않아 새로운 계절이 올 것이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잦은 요즘. 아직은 바람이 차갑지만 언제나 봄은 새로운 희망과 꿈의 은유로 사람들의 가슴을 따스하게 만든다. 그 먼 옛날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지구 반대편에선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의 죽고 죽이는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가파르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가지만, 그럼에도 그것들과는 무관하게 봄은 빠른 속도로 우리 곁에 오고 있다.
매서운 추위와 폭설이 어깨를 웅크리게 만드는 혹한의 겨울이 가면, 벚꽃과 개나리 피고 환한 햇살이 청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봄이 오는 것은 세상사 정한 이치.
비극적인 사건과 우울한 시간을 떨쳐낸 뒤 가벼운 옷을 걸치고 흩날리는 꽃잎 아래를 산책하는 빛나는 봄을 기다리며 읽을 만한 시 3편을 소개한다.
시인들은 예민한 감각의 촉수를 가진 사람들이라 누구보다 먼저 봄을 감지해냈다. 한국문학사에 이름을 새긴 빼어난 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봄을 노래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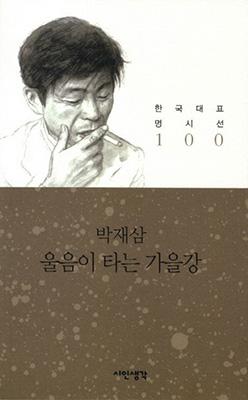
▲우울을 떨치며...박재삼 ‘봄바다에서’
미당 서정주가 “앉아서도 서서도, 심지어 잘 때도 시인임을 잊지 않았다”고 상찬한 제자가 박재삼(1933~1997)이다.
질박한 방언으로 우리 언어가 가진 매력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았던 박재삼은 짙푸른 ‘바다’에서 연분홍 ‘꽃밭’을 상상하며 봄을 맞았던 듯하다. 이런 노래다.
화안한 꽃밭 같네 참.
눈이 부시어, 저것은 꽃핀 것가 꽃진 것가 여겼더니, 피는 것 지는 것을 같이한 그러한 꽃밭의 저것은 저승살이가 아닌것가 참. 실로 언짢달것가. 기쁘달것가.
거기 정신없이 앉았는 섬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았닥해도 그 많은 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숨소리를 나누고 있는 반짝이는 봄바다와도 같은 저승 어디쯤에 호젓이 밀린 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것가.
우리가 소시적에, 우리까지를 사랑한 남평 문씨 부인은, 그러나 사랑하는 아무도 없어 한낮의 꽃밭 속에 치마를 쓰고 찬란한 목숨을 풀어헤쳤더란다.
확실히 그때로부터였던가. 그 둘러썼던 비단 치마를 새로 풀며 우리에게까지도 설레는 물결이라면 우리는 치마 안자락으로 코 훔쳐 주던 때의 머언 향내 속으로 살달아 마음달아 젖는단것가.
돛단배 두엇, 해동갑하여 그 참 흰나비 같네.
인간의 삶과 죽음이 결국은 멀리 있지 않음을 간파한 시인은 봄을 ‘한낮의 꽃밭 속에 치마를 쓰고 찬란한 목숨을 풀어헤치는’ 절절함으로 봤다.
그 절절함 속으로 날아드는 ‘흰나비’는 절망과 우울 속에서도 끝끝내 환히 빛나는 봄의 전령사가 아니었을까.

▲그래도 기어코 찾아올 계절...김광섭 ‘봄’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식민지의 지식인인 동시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은 독립유공자인 김광섭(1904~1977) 시인. 그가 살아낸 청년시절은 군국주의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냉혹한 겨울이었다.
그런 경험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광섭에게 봄은 멀어 보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누가 감히 봄을 막을 수 있을까? ‘가장 먼 데서부터’ 오고 있는 새로운 계절을 시인은 아래와 같이 예감한다.
얼음을 등에 지고 가는 듯
봄은 멀다
먼저 든 햇빛에
개나리 보실보실 피어서
처음 노란빛에 정이 들었다
차츰 지붕이 겨울 짐을 부릴 때도 되고
집 사이에 쌓은 울타리를 헐 때도 된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 데서부터 시작할 때도 온다
그래서 봄은 사랑의 계절
모든 거리가 풀리면서
멀리 간 것이 다 돌아온다
서운하게 갈라진 것까지도 돌아온다
모든 처음이 그 근원에서 돌아선다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버들강아지는 버들가지로
사람은 사람에게로
산은 산으로
죽은 것과 산 것이 서로 돌아서서
그 근원에서 상견례를 이룬다
(…후략)
‘멀리 간 것이 돌아오는’ 또는, ‘모든 것이 근원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시간이 결국 우리 곁에 올 것임을 노래한 김광섭. 그는 새로운 계절 봄 안에서 사람은 물론, 나무와 꽃까지 서로를 반기며 뜨겁게 포옹하는 희망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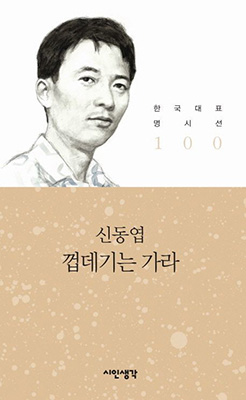
▲쇠붙이도 녹이는 거대한 힘... 신동엽 ‘봄은’
자신의 문학을 통해 통일과 자유를 소리 높여 외치던 ‘민족시인’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신동엽(1930~1969). 신 시인에게 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크나큰 힘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직접 겪었던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평화와 공존의 중요성을 체득한 신동엽은 다가오는 ‘봄’이 남과 북이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를 몰고 온’ 겨울이 끝나면, 이 나라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를 온통 뒤덮고 있던 ‘미움의 쇠붙이’가 눈 녹듯 사라질 봄이 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신동엽.
남북관계가 대립과 갈등만으로 치닫는 위태로운 2024년 오늘. 다시 펼쳐 읽어보는 시인의 ‘봄 노래’는 여전히 찬란하지만, 그 찬란함의 크기만큼 서글프다. 그래도 봄은 오겠지?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