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설, 고향을 노래한 詩 3편

21세기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애틋하게 떠올릴 고향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눈 쌓인 낡은 기와집 지붕 위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을 잘 따르는 강아지와 놀던 예닐곱 살 아이들이 “저녁 먹어라”는 엄마의 외침을 듣고는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동네.
가끔은 그리워지는 이런 모습은 이미 지난 세기의 풍경으로만 남았다. 21세기에 태어난 10~20대들의 고향은 천편일률 ‘콘크리트와 네온사인의 도시’라고 해도 무방한 시절이다.
하지만, ‘고향’이란 단어 안에 담긴 따스함과 포근함이 우리들 인식 속에서 온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듯하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흐려지는 것이야 세태니 어쩔 수 없다 해도.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인근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등도 설 명절이면 대다수의 자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을 향한다. 자신이 태어나거나 유년시절을 보낸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른바 ‘귀향(歸鄕)’.
설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올해도 적지 않은 이들이 주차장처럼 변하는 도로와 북새통을 이루는 기차 객실도 마다하지 않고 부모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갈 터.
이즈음 자연스런 연상 작용처럼 떠오르는 시 몇 편이 있다.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들 역시 사는 내내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3편의 시를 아래 소개한다. 부모, 형제와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고향집에서 읽기 좋은 것들이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정지용의 고향
일제강점기. 한국인은 물론 일본 예술가들까지 ‘식민지 조선의 가왕(歌王)’이라 불렀던 정지용(1902~1950)은 빼어난 서정시로 100년 세월을 뛰어넘어 독자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시인이다.
그의 고향은 충청북도 옥천. 정지용의 죽음은 비극적 기록으로 남아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납북된 것인지, 그게 아니면 폭격에 목숨을 잃은 것인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그래서일까? 그가 노래하는 ‘고향’은 이상스레 슬프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 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뫼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채 쉰 살이 되기 전 맞았던 죽음을 예언이라도 한 것일까? 고향에 돌아가도 ‘마음은 먼 항구로 떠돈다’는 시인의 우울한 진술은 떠도는 것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비극적 세계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년의 풀피리 소리’와 ‘여전히 푸른 고향 하늘’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또한 거기 고향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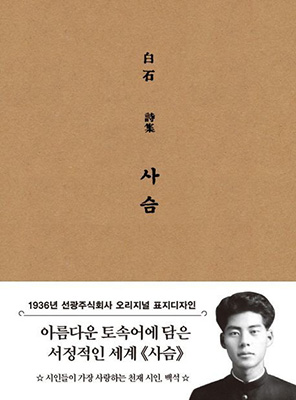
▲그리운 아버지 떠올리는… 백석의 고향
‘시인 중의 시인’ ‘시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시인’으로 유명한 백석(1912~1996) 역시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 바깥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내야 했다. 어렵게 떠난 일본 유학과 경성에서의 기자 생활, 멀리 만주까지 오가며 지쳐 있던 그는 또 다른 타향 북관(北關·함경도)에서 더없이 따뜻한 한 노인을 만난다. 그를 매개로 백석이 ‘고향’을 떠올리는 방식은 이런 형태다.
나는 북관에 혼자 앓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씨 아느나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는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그게 자의건 타의건 돌아가고픈 곳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20세기 사람들에게 고향이란 그리움과 갈증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고향을 자신을 진맥하는 늙은 한의사의 손길에서 느낀 백석. 거기에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고 쓴 건 비단 시인만이 아닌 누구에게나 그리움의 대상이란 하나가 아닌 다수임을 보여주는 게 아닐지. 그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고향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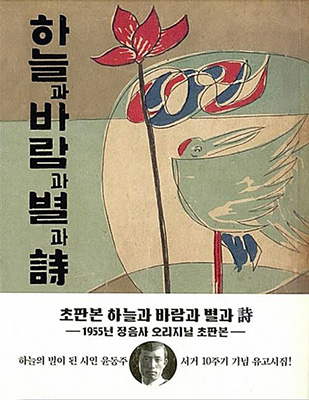
▲살아서 돌아가야 할 이상향… 윤동주의 고향
일본의 강제 점령에서 해방되기 불과 6개월 전. 군국주의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해사하고 순정했던 유학생 한 명이 안타깝게 사망한다. 시인 윤동주(1917~1945)였다. 겨우 스물여덟의 창창했던 나이.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이른 죽음과는 무관하게 한 세기 내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 영민하고 예민한 예술적 촉수를 가졌던 윤동주의 시 ‘또 다른 고향’은 다른 여러 작품들과 함께 여전히 독자들을 아프게 매혹한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 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식민지의 서글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앙상한 ‘하얀 해골(백골)’에 빗대 자아를 잃은 민족의 눈물과 울음을 그려낸 이 시는 이상향(理想鄕)이라 불러도 좋을 ‘또 다른 고향’이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동시에 묻고 있다.
자신만의 입신출세를 위한 공부를 거부하고, 척박한 조국의 현실을 빛나게 바꿔보고자 애썼던 ‘애국지사형 시인’ 윤동주에게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고향처럼 그리운 또 하나의 이데아가 아니었을까 싶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