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읽기 좋은 詩 3편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라오스. 라오스와 태국, 베트남과 캄보디아까지 남동아시아 전역을 훑으며 흐르는 황톳빛 메콩강엔 하루하루 그물을 던져 식구들의 밥을 구해야하는 어부들이 산다. 인도네시아 바다를 근거지로 살아가는 어부들도 마찬가지다. 붉은 해가 저물며 2023년의 마지막을 알릴 때도, 떠오르는 태양이 2024년의 시작을 알리던 1월 1일에도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듯 무심한 마음으로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터. 그게 자신과 아내, 아들과 딸의 생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 누구나 희망과 꿈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희망’과 ‘꿈’이란 단어 속엔 필연적으로 눈물과 땀이 스며있을 수밖에 없다. 굳이 200여 년 전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경직되고 고답적인 선언과 진술을 가져다붙이지 않더라도, 인간을 인간으로 살게 만드는 건 ‘성실하고 부지런한 노동’이 아닐지.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밝았다. 지난 시절과 다름없이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가족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악전고투(惡戰苦鬪)할 것이다. 1년 365일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눈앞에 닥친 그 세월 속에서 ‘열심히 자신의 에너지를 다해 싸우듯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위로가 될 짤막하지만, 울림은 큰 3편의 시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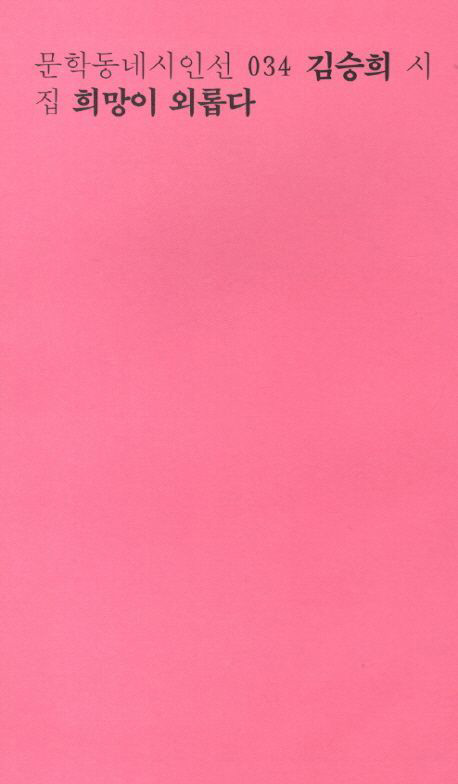
▲세상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느끼려면… 김승희의 시를
좋은 시(詩)는 짧다. 이는 이미 오래된 수사다. 하지만, 그 문장에 담긴 진정성은 세파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시가 다른 문학 장르와 명확히 구별되는 지점은 ‘촌철살인(寸鐵殺人)’이 아닐까. 1~2줄의 짧은 문장으로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간파해내는 것. 그게 없다면 시는 ‘길게 늘여 쓴 산문’과 다를 바 없다.
고희(古稀)를 넘긴 시인 김승희(72)가 딱 6줄로 정의하는 ‘희망’은 이른 아침 마시는 한 잔의 맑고 차가운 물처럼 명확하고 명징하다.
그렇다. 결국 희망이란 시처럼 ‘은유’로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희망에는 신의 물방울이 들어있다’는 제목의 노래다.
꽃들이 반짝반짝했는데
그 자리에 가을이 앉아 있다
꽃이 피어 있을 땐 보지 못했던
검붉은 씨가 눈망울처럼 맺혀 있다
희망이라고…
희망은 직진하진 않지만.
세상 모든 만물은 ‘잉태-성장-소멸’이라는 정해진 길을 걷는다. 성장의 절정에 이른 ‘꽃이 피어 있을 땐 보지 못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이 물음에 시인은 자답(自答)한다. “검붉은 씨”라고.
‘희망은 직진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은 성장 이전의 잉태를 마음의 손길로 촉진할 수 있었기에 찾아낼 수 있었던 세상사의 진실이 아닐까.
시인 김승희가 발견해낸 잉태와 성장, 소멸의 엄정한 사이클을 돌아본다는 건 범인(凡人)을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평범한 생을 살아온 보통의 독자라고 그걸 못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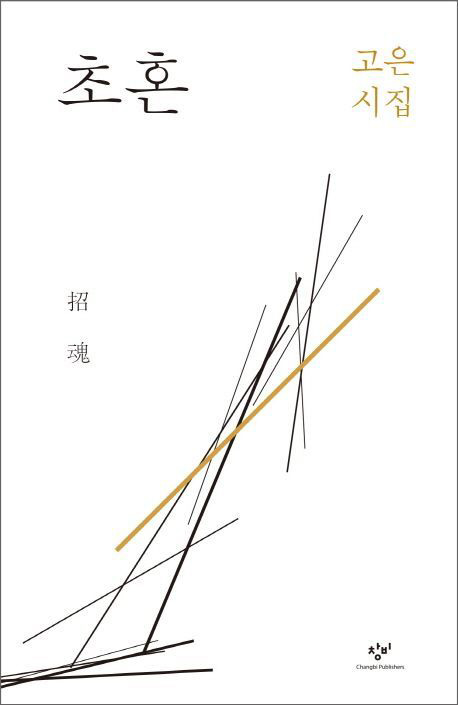
▲시작할 때 끝을 미루어 예언하려면… 고은의 시를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조금 거칠게 이 명제를 설파한 예술가들은 “너와 내가 다를 것 없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시인 고은(91)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빛나고도 지난했던 혁명과 쿠데타, 개발독재와 민주화시대를 한 세기 가까이 자신의 온몸으로 살아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의 절창 ‘문의(文義)마을에 가서’는 막급 100년 세월을 격랑의 한국 현대사 속에서 헤엄쳐온 사람이 아니면 토해낼 수 없는 시다. 이런 것이다.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것을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닫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뻗는구나
그러나 삶은 길에서 돌아가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문득 팔짱 끼어서
먼 산이 너무 가깝구나.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는가.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한 죽음을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본다.
모든 것은 낮아서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 문의여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길’과 ‘마을’, ‘눈’과 ‘죽음’이라는 단순한 4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명명백백 밝혀내는 고은의 문장 앞에 더 이상 무슨 부연이 필요할까?
지금은 구설(口舌) 속에 웅크리고 있는 시인이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의 시간이 더 흘렀을 때 “한 세기 전 한국엔 어떤 시인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거기에 “고은”이라 답할 이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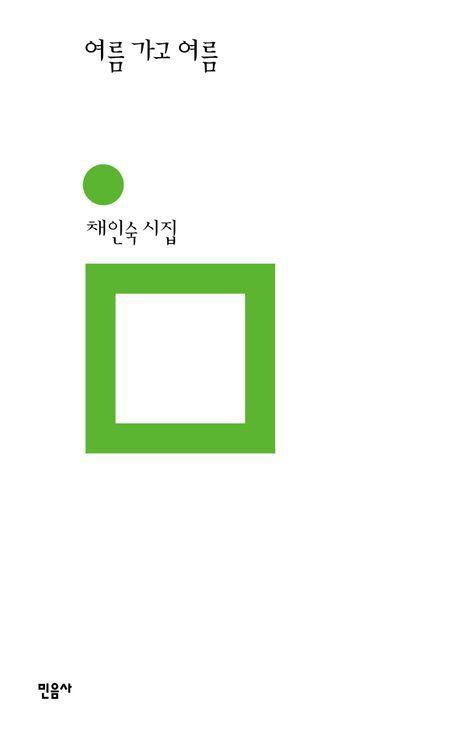
▲누군가 오늘의 나를 만든 과거를 묻는다면… 채인숙의 시를
사람의 ‘오늘’은 과거라 통칭하는 ‘어제’의 총합이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고,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 발현된다.
지난 세기 말인 1999년 한국을 떠나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시인 채인숙(53)은 시집 ‘여름 가고 여름’을 통해 미루어 볼 때 문학소녀였음이 분명하다.
2015년 ‘오장환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시인의 꿈을 이룬 채인숙은 자신의 과거를 다음과 같이 진솔하게 고백한다. 시 ‘1989’를 통해서다.
대학 도서관에서 가끔 책을 훔쳤다
바코드니 전자출입증 따위는
없던 호시절이었다
스웨터 안쪽 바지춤에
시집을 두 권이나 꽂고
호기롭게 팔짱을 끼고 도서관을 나왔다
문학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길래
대학을 갔는데
존경할 만한 스승도 없고
가슴 뛰는 수업도 없었다
다행히, 아까운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려면
책이라도 훔쳐야 한다고 가르쳐 준
친절한 선배가 있었다
지금도 내 책꽂이엔 대학도서관 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힌 누런 시집 몇 권이
무슨 전리품처럼 꽂혀 있다
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맹랑한 도둑년이었다
김수영과 최승자는 늘 선수를 빼앗겼다
그때도 분했는데 지금도 분하다
아직도 버릇을 못 고치고
번번이 훔쳐 쓸 궁리를 한다.
‘1989년’은 아마 채 시인이 대학에 들어간 해였을 것이다. 당시는 무력을 수단으로 정치권력을 강탈한 군인이 대통령을 하던 때. 다수의 청년들이 환멸과 허무 속에서 살던 시절이다.
억지로라도 ‘희망’과 ‘꿈’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신이 자신의 ‘정신적 무릎’을 스스로 부러뜨려야 했던 그때. 채인숙은 희망과 꿈의 실마리를 책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자청해 ‘맹랑한 (책)도둑년’이 됐을 터.
“그런 과거가 그럭저럭 살만해진 현재가 됐다고 온전히 잊혔을까?” 채인숙의 시는 아프게 질문한다.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에겐 쉽지 않은 물음이다. 그러나, 의미는 심장하다. 고래로부터 좋은 시는 풀기 어려운 난제(難題)와 같았으니.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