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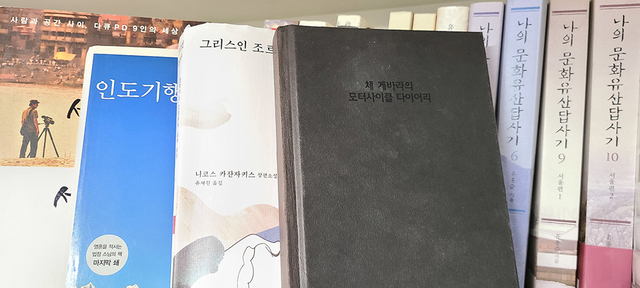
서늘해지며 여행을 다녔다. 하늘은 푸르고 사람이 걷기에 안성맞춤인 바람이 불어와 다니기에 더 좋았다. 기분 좋은 바람이 겨울바람으로 한 단계 높여도 차를 타고 다니니 어디든 나설 수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은 못하는 터라 당일치기 국내 여행으로 일정을 잡았다. 영양을 서너 번, 경주는 옆집 드나들 듯했고, 그림 전시회와 사진전까지 마스크를 쓰고서도 잘도 다녔다. 그리고 여행기를 글로 남겼다.
우리 민족이 지금에 와서야 여행을 즐긴 것은 아니다. 한반도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듣고 본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중 상당수는 사라졌지만, 일부는 현재까지도 전한다. 빈왕록, 표해록, 제목만 듣고 무엇에 관한 책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왕오천축국전, 열하일기를 더하면 여행의 기록인지 알게 된다. 빈왕록은 고려 중기에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며 느낀 바를 이승휴가 시로 정리한 것이고, 표해록은 고향 나주로 가려고 탐라(제주)를 출항했다가 중국으로 표류한 최부의 기록이다.
견문록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인도를 여행한 선배들과는 달리 해로로 가서 육로로 돌아오는 새로운 인도 여행로를 개척했으며, 그 여행기 또한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관한 세계 유일한 기록이고, 대당서역기 등에서 누락 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자 했다는 점 등에서 귀중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여행기 중에 그나마 우리에게 알려진 책은 박지원의 열하일기 정도이다. 지인들에게 읽어본 여행기가 있느냐 질문했을 때 나온 대답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책이 아니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하멜표류기, 돈키호테, 걸리버 여행기(조너선 스위프트가 쓴 풍자소설이니 여행기라고 하기보다 기행문 형식이라 해야 맞다.) 등속이었다.
나 또한 열하일기만 읽어보았을 뿐이다. 조선 정조 때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온 연행일기로 ‘호질’, ‘허생전’은 열하일기를 모르는 사람도 아는 이야기이다.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기록을 남길 정도로 여정의 모든 일화를 기록으로 남긴 박지원은 여행 보따리에 글을 쓰기 위한 도구가 제일 많았다고 하니 기록에 대한 그의 철저함이 엿보인다.
조성원 작가는 우리나라 고전 작가의 대표 박지원을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의 세르반테스와 비교했다. 여행과 연행이라는 형식의 비슷한 점과 돈키호테에게 산초가 있다면 열하일기의 박지원에게는 장복과 창대의 익살스러움과 의리가 잘 묘사되어 있어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현의 자유로움과 주인공의 인간적인 매력과 더불어 ‘철학’이 있다는 유사함도 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반면에, 열하일기는 우리에게조차 덜 알려진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고 한다. 그러니 발로 뛰며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독서의 한 방법인 것이다. 나는 여행 짐을 싸면 일주일 단위로 책 한 권, 그 이상의 여정일 때 또 한 권을 더 가져간다. 소설이나 가벼운 내용보다 고전 같은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챙긴다. 짐 가방이 무거운데도 책을 넣어가는 이유는 낯선 곳에서의 불면증 때문이다. 여행의 피로감이 밀려올수록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때마다 책을 펼쳐 읽다 보면 수면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터키에서 버스로 8시간을 이동할 때 고미숙의 열하일기를 읽어냈고, 와이파이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스페인의 밤은 돈키호테와 함께 했었다. 다음에 서서 하는 독서의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의 여행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들고 가서 혜초와 심오한 대화를 나눠 볼 생각이다.
앞선 이들의 여행기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도종환 시인의 처음 가는 길이란 시를 읊조려 본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은 없다. 다만 내가 처음 가는 길일뿐이다. (중략) 자기 전 생애를 끌고 넘은 이들이 있다. 순탄하기만 한 길 아니다. 낯설고 절박한 세계에 닿아서 길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