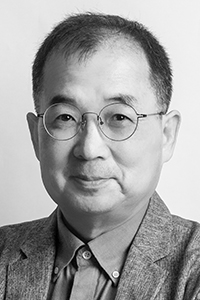
502년 전 오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 그는 왜 그랬을까. 무엇이 못마땅하여 무엇을 바꾸기 위하여 그런 용기를 내었을까. 비르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의견서’를 내걸었을 적에, 그는 어떤 세상을 꿈꾸었을까. 교황과 교회가 신의 생각을 대신한다면서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일이 불편하였다고 한다. ‘면죄부’를 돈받고 팔면서 지은 죄까지 용서한다는 만용과 권력에 저항의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하늘의 생각과 말씀을 교황의 손에서 옮겨 보통 사람의 손에 올려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교회였다. 오백 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다른 결들이 있다고는 하나, 지면에 오르내리는 오늘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프로테스탄트’가 저항의 마음을 담기는 하였으나, 폭력과 막말을 권한 적이 없다. 이성과 성찰을 거듭하며 화합과 평강의 하늘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세상보다 높은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지만, 차별과 혐오를 주장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을 믿음의 문을 통하여 화합과 소통을 이루고 싶었겠지. 한 사람의 주장에 휘둘리는 세상은 공평과 정의에도 어긋난다. 생각을 모으고 모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려 하지 않았을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저 겁박은 면죄부를 팔았던 그 교황과 무엇이 다른가. 말씀의 힘과 생각의 영향력은 누군가의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손과 삶에 달린 게 아닐까.
사람은 모두 부족하다. 무엇이 모자라도 모자라고 어느 구석이 부족해도 부족한 게 인간이다. 모자라고 불편한 가닥을 핑계삼아 덜어내고 차별하며 편가르고 담장을 쌓노라면, 끝내 상처와 아픔만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지 않을까. 신학자 데이브 톰린슨(Dave Tomlinson)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환영받으며, 희망과 꿈을 나누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종교가 세상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으며, 믿음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 해석하지도 않았으면 한다. 루터의 용기와 생각을 다시 살펴,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복하며 이웃과 함께 힘을 내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게 북돋우는 믿음의 터전을 만나고 싶다.
세상이 어둡다. 빛을 잃은 세상에 희망을 던지는 교회를 만나고 싶다. 거친 언사와 휘두르는 주먹은 그만 보았으면 한다. 내뱉는 욕설과 거북한 막말도 그만 들었으면 한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모습은 아니었으면 한다.
굴곡진 세상을 힘내어 건너게 하는 다리가 어디 없을까. 무너지고 흩어진 세상을 모으고 꿰매는 손길이 혹 어디 없을까. 미움과 단절의 그늘이 사라져야 한다. 나눔과 대화의 마당이 늘어나야 한다. 조금씩 달라도 어차피 사람이다. 조금만 달리 보면 누군들 함께 못할까. 루터가 꿈꾸었던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었을까.






























